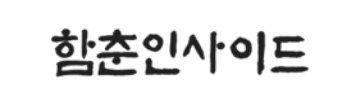[비전추진단뉴스레터]
생성 AI를 이용한 논문작성
임상교수님들의 건의사항/의견은 아래 메일을 통하여 비전추진단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상교수는 서울의대의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서울의대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후속 세대이고, 서울의대 후속 세대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임상교수님들이십니다. 김정은 학장님 이하 현 학장단에서는 비전추진단을 통해, 병원 임상교수와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대학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비전추진단은 카카오톡 채널 [新서임당: 새로운 서울의대-임상교수 소통마당]을 개설하여 의과대학에서의 소식을 임상교수님들께 전달하고, snuh@snu.ac.kr 메일 계정을 통해 임상교수님들의 건의와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임상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서울의대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제언 부탁드립니다.
비전추진단 올림생성 AI를 이용한 논문작성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 간이식 팀에서 진료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무입니다. ChatGPT가 출시된 이후부터 약 3년째 “병원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 및 연구목적 활용”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도 아니고, 원래 개발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다만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연구도 조금씩 하고 있던 일반 임상의입니다. ChatGPT 출시 전부터 GPT-3를 몰래 사용하곤 했는데, ChatGPT 출시 이후 다양하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 원내강의를 몇 번 한 이후에 여러 곳에서 불러 주셔서, 강의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그맣게 핸즈온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 교수님들께 AI활용법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의정갈등으로 인해 연구논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나기 전부터 이미 현장에서는 임상로딩의 증가로 연구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여러 교수님들을 많이 뵙곤 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런 상황에서 연구 프로세스의 효율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독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있지만 이들에게 큰 미션을 던져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보신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연구과정은 멀리서 보면 매우 고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작은 간단한 일들의 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은 일들을 잘 정의하고 단계별로 요청하고 그 결과물을 조합해 보면 훨씬 양질의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멘토링을 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학생이나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일을 잘 나누고 잘 가르쳤던 교수님들께서는 똑같이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정확한 지시와 압박만을 통해 일을 지시하던 분들께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구조화하고 잘 정리해서 체계화한 이후에 어떤 명령(prompt)을 인공지능에게 던져 줄지 사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개된 여러 서비스들은 고유의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워낙 빠른 업데이트로 인해 매번 순위가 바뀌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OpenAI의 ChatGPT는 일반적인 문제해결, 코드 작성, 이미지 생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특히 Deep research 기능을 활용하면 연구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가짜논문을 인용하는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thropic사의 Claude는 글쓰기, 코드 작성 측면에서 성능이 뛰어나고 MCP (Model Context Protocol)를 활용하면 다양한 도구와의 연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쓰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많은 일들을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Artifact라는 기능을 이용한 시각화 능력이 좋아서, 논문에 활용할 수 있는 도표를 제작하거나 간단한 시각화 자료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됩니다. 구글에서 만든 Gemini는 기능이 앞서 언급한 모델들보다 떨어져서 많은 유저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2.5 Pro부터 기존 서비스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서기도 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딩, 검색 등에서 장점을 보이고 구글의 기존 도구들(Google docs, colab, Drive, Slides)과의 연동성 측면에서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Perplexity는 검색기능이 뛰어나고 자료 조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먼저 검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경험하는 광고나 부정확한 정보를 쉽게 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월 20$정도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LLM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의학연구영역에서는 반드시 팩트 체크가 필요하며, 연구의 결과물인 논문작성시에는 저자로서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학술저널에서도 저자 투고 가이드라인에 AI writing 섹션이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주로 가독성 향상 위주로 써야 하고, 문장을 다듬는 데 사용하고, 사용을 했으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며, AI는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주의해서 사용한다면 이미 연구경험이 있으신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충분히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연구경험이 없는 학생들, 전공의들에게 이것만을 활용하여 모든 연구과정을 비판적인 사고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직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팩트 체크할 정도의 배경지식은 갖추고, 방법론적으로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이 맞는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사용은 마치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지도교수로서 이런 부분을 멘토로서 잘 지도해 주신다면 연구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얻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나 핸즈온 이후 몇달 뒤 교수님들을 뵈면서 “잘 쓰시나요?” 여쭈어 보면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수는 “나는 그냥 옛날방식이 편해서 그냥 그렇게 아직 하고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사실 AI세상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네모난 바퀴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동그란 바퀴로 갈지 않고 힘겹게 수레를 끄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강의를 듣거나 관련 유튜브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직접 창을 열고 프롬프트를 쳐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들을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단계에만 머문다면 AI의 능력을 나의 능력이라는 잣대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충분히 인간의 능력 이상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능력이 없어도 나만의 앱을 만들어 보거나, 내가 잘 모르지만 배우고 싶은 영역들에 대해 하나씩 물어가면서, 자신의 역량 강화도구로서 활용을 하신다면 연구와 진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투자는 결국 더 많은 시간을 아끼고, 더 나은 연구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