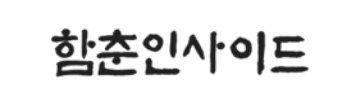[수상소식]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 연구실, 제2차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11월 26일(화)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 연구실의 SPARK팀(팀장 백지윤 박사과정생, 팀원 박규리 석사과정생)이 제2차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신애선 교수 연구실은 지난해 제1차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본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영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립암센터가 공동 주최하여 암 공공라이브러리 활용과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63개 팀이 참가하였다. 서류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팀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의 암 공공 표본 데이터를 활용해 4주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0월 22일(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 평가를 받았다. 심사는 8인의 전문가가 연구 우수성, 발표 능력, 기대 효과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SPARK팀의 뛰어난 분석력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연구팀은 ‘암 진단 후 병기별 치료 지연이 환자 예후에 미치는 영향: 대장암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 자료, 통계청의 사망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이용 청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및 자격 자료를 연계한 암 공공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암 환자의 진단부터 치료 및 예후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체 53,485명의 대장암 환자 중 28,520명을 대상으로 암 진단 시점의 병기별로 3개월 및 6개월 치료 지연에 따른 환자 사망 위험을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치료 지연이 3개월 이상(<3개월 대비)인 경우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국소진행암(aHR: 1.69 [95% CI: 1.42–2.02])에서 가장 높은 위험이 관찰되었고, 이어서 국한암(1.55 [1.24–1.93])과 원격전이암(1.29 [1.09–1.53]) 순이었다. 6개월 이상 지연(<6개월 대비)에서는 국한암(2.91 [2.24–3.78])에서 가장 높은 위험이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소진행암(2.63 [2.07–3.35])과 원격전이암(1.47 [1.15–1.89]) 순이었다.
본 연구는 특히 초기 병기 대장암에서 신속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병기별 적절한 치료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최적의 대장암 환자 관리 전략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형진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

최형진 교수(해부학교실)가 2025년 1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학·연·산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 중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과학기술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매월 1명씩 선정하여 시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최형진 교수는 GLP-1(Glucagon-like peptide-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비만치료제가 식욕을 어떻게 억제하는지에 대해 규명했다. GLP-1은 식사 후 장에서 분비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의 유사체인 GLP-1 기반 치료제는 2005년 당뇨병 치료제, 2014년 비만치료제로 각각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최근 GLP-1 기반 비만치료제가 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와 함께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으나 GLP-1이 뇌의 어느 부위에서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최형진 교수는 GLP-1이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람의 뇌 조직에서 GLP-1 수용체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시상하부 신경핵에서 높은 발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마우스 모델을 통해 GLP-1 수용체 신경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면 식사 중단을 유도하고, 반대로 억제하면 식사를 계속하게 되는 것도 입증했다.
최형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식욕이 뇌에서 어떻게 조절되고, GLP-1 식욕억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뇌과학 도구를 활용하여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앞으로 현대인들의 대사질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식욕억제제 개발에 도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