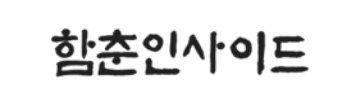[공감마당]
6년 학생 연구의 여정 - Science를 내기까지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2월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많은 운이 따라 감사하게도 공동 제1저자로 Science지(IF=56.9)에 논문 ‘GLP-1 increases preingestive satiation via hypothalamic circuits in mice and humans’를 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컸던 주제를 제가 직접 제안해서 시작했던 연구였기에 그만큼 애정이 컸고, 20대 초중반의 열정을 진심으로 쏟아부었던 연구인 것 같습니다. 몇 년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으나 결국 끝까지 해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사실 제게는 의의가 큰 것 같고, 특히나 공동 제1저자 김규식 선생님, 황은상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실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상만 해봤었던 높은 저널에서 좋게 봐 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안이 벙벙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과정과,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대 입학 당시에 저는 막연히 연구를 해 보고 싶었고, 마침 예과 때 교내 의학연구멘토링(현 의학연구의 실제) 프로그램 공고로 올라온 연구실 리스트를 보면서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제 및 활동 내용이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최형진 교수님의 랩에 지원하였습니다. 예과 방학 기간 및 주중 공강 시간 등을 활용해서 연구실에 진행되고 있었던 기초연구에 참여하면서 쥐 분변 닦기, 뒷정리, 카메라 설치부터 시작해서 쥐 화학유전체학 행동실험을 도우며 행동실험, 논문 공부, 저널미팅, 학회참석을 하며 성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연구실에 fiber photometry, optogenetics, miniature microscope와 같은 최신 기술이 차례차례 새롭게 들어오고 세팅되며 해볼 수 있는 실험의 폭이 넓어졌고, 연구실 선생님들과 새로운 장비로 새로이 실험들을 기획하여 밤늦게까지 토론 및 실험도 해 보며 수많은 실패와 함께, 성공했을 때 해냈다는 기쁨과 희열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예과 2학년 당시 연구실에서 임상연구를 해 볼 기회가 주어져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처방한 식욕억제제인 liraglutide의 체중감량효과 및 당뇨 관련 표현형 지표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과 기초의학통계학 수업 수강한 내용과 코딩 독학을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 통계를 바탕으로 논문을 내게 되었는데, 이 임상연구를 진행하던 도중 삭센다를 맞고 나서 음식을 보기만 해도 먹기 싫어지고 식욕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문득 GLP-1 Receptor agonist(GLP-1RA)인 삭센다가 호르몬적 영향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 뇌에 작용할지, 단기간에도 즉각적으로 식욕을 억제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 문헌들을 조사해 본 결과 GLP-1RA가 뇌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관여하는 circuit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GLP-1 수용체가 많이 분포한 부위 중 하나인 Dorsomedial hypothalamus(DMH)에 대해서는 실시간 신경활성 효과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년간 함께했던 대학원생 선생님들도 함께 있는 이 연구실에서 작게나마 제 연구를 진행해 보고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실에 있어오면서 익숙해졌던 동물연구 실험tool들(fiber photometry, optogenetics, miniscope)을 활용하여,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사람에서 삭센다 투여 시에 음식을 먹기 전 인지만 하더라도 느끼는 배부름의 정도가 커진다는 임상현상을 보이고, 기초연구를 통해 이 기전을 밝혀, GLP-1 투여가 시상하부의 DMH GLP-1R 신경활성 예민도를 높임으로써 인지적 배부름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밝힌 것이 본 연구였습니다.

긴 기간 함께 공동 제1저자인 김규식 선생님과 연구 기획자이자 실무자로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하며 행동실험을 수행하고, 임상시험을 기획 및 진행하며, 매트랩 코딩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및 figure 완성, 글 작성, 투고, revision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미국의 Kevin W. Williams 교수님과 황은상 박사님 연구팀과 협업을 하며 연구와 투고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연구 과정을 돌이켜 보면 실제로 의학적 임상지식과 생물학(광유전학, 화학유전체학 등), 공학(컴퓨터 모델링, 머신러닝, 매트랩 코딩) 등의 분야가 어떻게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논문이 작성되는지 피부로 느끼면서 직접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결과를 창출해낸다는 것이 주는 학문적 기쁨과 보람을 느꼈고, 본 결과도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셨기에 나올 수 있었기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꼭 가져야한다는 점도 되새겼습니다. 또 연구실 선생님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의 매력과 즐거움과 함께, 연구의 실무자로서 과정 중 겪게 되는 어려움, 연구자들 간 소통 및 협력의 중요성, 학회에서 국제적 교류 및 언어적 소통과정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학업과 병행 등의 측면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으나, 함께 연구를 진행하던 분들, 그리고 진행하고 있었던 연구의 가치를 믿었기에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학부시절 상당시간을 연구에 매진하며 뜻깊은 20대 초중반을 보냈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학부생 때 극복해서 결국 끝까지 연구를 해내었던 경험이 제가 연구하는 의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은 정말 탐구해 보고 싶었던 주제라서 즐겁게 시작하였으나, 다년간 이를 지속적으로 해내려면 재미만 가지고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대가 분들께서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는 ‘good science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회에서 본 모든 훌륭한 교수님들, 선생님들 모두 그 방식은 다양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학문을 대하는 진심만큼은 굉장히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필연적이고, 학계도 사회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만큼 학계 내에서도 경쟁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상생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융합의 시대이자 학문 간 경계와 벽이 허물어진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다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진 요즘인 것 같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good science’라는, 학문에 대한 진심이라는 순수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또 돕고 함께 발전해야 결국 그것이 모두 나의 역량 강화로 돌아오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음을 느낍니다.
어떤 일을 하든, 서울의대 후배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뛰어나신 인재들이신 만큼 앞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중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면서 모두 함께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진로에 대해 계속 고민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힘드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 메일(mattty0514@snu.ac.kr)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