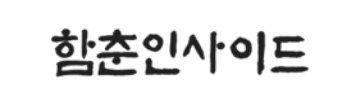[공감마당]
빈 공간 모험하기

빈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 사이로 숨어드는 걸 좋아합니다. 학교를 조퇴하고 빈 오전에 빈 아파트 단지 사잇길을 따라 집으로 걷던 초등학생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15분 남짓한 거리에 30년 동안 잘 자라 하늘을 반쯤 뒤덮은 나무들은 노인보다도 조용했습니다. 시끄러웠던 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진 햇빛과 왕복 이차선 신호등의 깜박이는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공간이 그렇게 조용하다니. 저에게는 몇 안 되는 추억입니다.
교복을 입게 되며 그런 공간의 창은 좁아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빈 틈을 노렸죠; 새벽과 아침 사이.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아침 일찍 7시 10분이 3학년 등교시간으로(8시 10분에 시작하는 1교시 전에 0교시를 우겨넣은 결과) 주변 고교보다 빠르기로 유명했지만, 저는 그보다 빠르기로 학급에서 알아줬습니다. 6시 20분에 집을 출발해 6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하면 평소에는 잠겨 있는 급식실 쪽 뒷문이 식재료 반입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교문 앞 생활지도를 중학생 때부터 질색하던 저에게는 너무나 평화로운 통로였죠. 일단 통과하면,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긴 복도는 아무도 없었고 교실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다른 학생과 선생들이 등교하기 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실이 시끄럽고 답답하면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 숨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이 자습 시간이었던 고3이라 한 명쯤 교실에서 나가도 학교 안에만 있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옥상문은 소방 권고가 무색하게, 만화적 허용 없이 자물쇠와 쇠사슬로 철컹 잠겨 있었지만 잠긴 문 바로 앞 계단참에는 책걸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에어컨이 안 닿는 곳이라 여름에는 더위에 슬라임처럼 축 늘어져서 문제를 풀곤 했습니다.
대학교를 와서도 빈 박스를 찾는 고양이와 같은 습성은 버리지 못해서 예과 시절에는 중앙도서관 구석의 낡은 책상에서 졸았고 널널한 교양 강의만 있는 금요일에는 남들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 빈 공간을 즐겼습니다. 본과에 진급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9시 수업 시작 전 텅 빈 양윤선 홀, 박희택 홀에 앉았습니다. 병원 실습을 시작하고도 살금살금 병원 속 공간의 빈 시간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꼭 던전과 미로와 호그와트 같아서 그런 틈이 원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연말시험 전날 밤을 새고 일찍 아침과 에너지 드링크를 사러 대한외래 편의점에 갔을 때, 마치 일찍 등교한 고등학교처럼 조용했던 병원을 기억합니다. 1시간만 지나도 내원객들과 수많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내원객으로 붐빌 공간도 그렇게 조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쁜 낮에도 그런 조용한 순간이 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텅 빈 수술장 휴게실에서 멋모르고 잔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잘 졸았는데, 어린이병원 5B 회의실에서 빈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오후 3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오신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를 깨워 주신 적도 있습니다; 학생도 같이 들으시게요?
언급한 곳들 외에도 병원에는 빈틈이 많습니다. 분당병원 1동 지하 3층의 International Fellow Locker Room이었나 비슷한 이름의 방은 늘 비어 있어서 식당에서 테이크아웃한 간편식을 먹기에 좋습니다. 가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인사와 스몰톡을 당해낼 자신만 있다면요. 분당에서 혜화로 돌아가는 셔틀을 타기 전 시간이 애매하다면 지석영 의생명연구소 로비에서 잠시 쉬는 것도 추천드려요. 정말 소파가 푹신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는 빈틈도 병원 구석구석을 연결합니다.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연건 본관 건물 5병동을 꿰는 엘리베이터처럼요. 앞으로 기대되는 공간도 많습니다. 특히 저는 절대 못 써 보고 졸업하겠지 생각했던 의학도서관은 벌써 재건축이 끝나가네요. (병원 내원객들에게 잘 보이는 위치에 학생들이 공부할 열람실이 있어 벌써 서울대 의대 동물원이냐는 별명도 얻은 곳입니다.) 여러분도 병원이란 던전을 탐험해보세요! 가운이라는 적절한 모험용 망토와 신분증이란 아이템만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곳들이 열려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시끌벅적한 시장은 외래 진료가 끝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님들은 떠나고 주인들만 남습니다. 다들 돈을 내거나 돈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실습 학생은 있기에 애매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학생 당직실이 있는 분당병원은 다르죠. 저녁만 와도 병원은 조용하고, 밤에는 적막하기 그지없어서 1층 로비에서 누가 전화하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병동에서는 작은 기침소리와 신음소리도 크게 들리고 지금 복도에 몇 명이 걷는지 셀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원이 던전이라면 조그만 소리만 내도 그 층의 모든 몬스터들이 덤벼들었겠죠. 다행히 병원은 복잡하고 층층마다 무서운 선생님과 환자들이 꼭 있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 실습에선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보스몹이 아니듯이 병원도 던전은 아닙니다. 충분히 조용히만 지낸다면 학생은 조용한 병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은 평화로워라.
휴학을 하며 빈 시간이 생겨버렸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그 시간을 채우려 의학 도서관에 들렀는데, 잠시 병원을 통로 삼아 지나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 우는 소리로 병원 중에서도 가장 시끄러웠을 어린이병원도 조용했습니다. 가운과 병원증이 없어서 들어가보진 못했지만 수술장도 평소보다 조용했겠죠. 요즘은 어떨까요? 병원이란 어디선가 퍼오는 마력으로 끝없이 자라나는 미궁 같은 곳이라서(병원 사람들이 그렇게 피곤해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건 분명 그 마력 때문입니다) 빈 공간과 빈 시간을 메우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병원은 늘 공사 중이고, 빈 병실은 다음 환자로, 빈 수술장은 다음 수술로 채워지고, 빈 강의실은 컨퍼런스가 예약되며 그래도 남는 빈 공간은 저 같은 사람들이 몰래몰래 채우겠죠. 만약 그럼에도 도저히 채울 수 없을 만큼 빈 곳이 많다면 병원은 스스로 작아지는 길을 선택하겠죠. 원래 마력이 부족한 미궁은 크기를 줄여서 자신을 유지하니까요. 지금 병원은 아파 보이고 마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전 병원에는 다양한 마력이 있었습니다; 최고라는 자긍심, 치료하겠다는 욕심,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는 오만. 스스로 자라나는 마력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오는 힘들도 많았습니다; 후원, 애정, 질투. 마력들이 줄어들어서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치고 약해지는 것일까요.
최근 재밌게 본 만화 던전밥에는 던전 속 빈틈에 사는 센시라는 드워프가 등장합니다. 다른 모험자들은 잠시 공략하고 떠나는 던전에서 살기를 선택한 센시는 던전의 마력을 먹고 자란 마물들을 요리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살기에 센시는 던전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는 병원의 소중함을 알까요? 던전처럼 모두가 이상적으로 건강한 세계에서 병원은 없겠지만, 판타지 세계에서 던전이 필요한 만큼 우리 세상에도 병원은 필요합니다. 던전이 판타지 사회에서 마력의 원천이 되듯, 병원은 현대 사회에 주는 마력-건강해지는 힘, 더 나은 건강을 찾으려는 탐구심 등-의 원천이 되니까요. 언젠가는 돌아갈 병원이 이전처럼 넓은, 그러나 세상을 병원화시킬 정도로 넓지는 않은 미궁이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빈 공간을 헤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