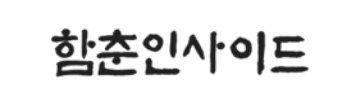[공감마당]
오르막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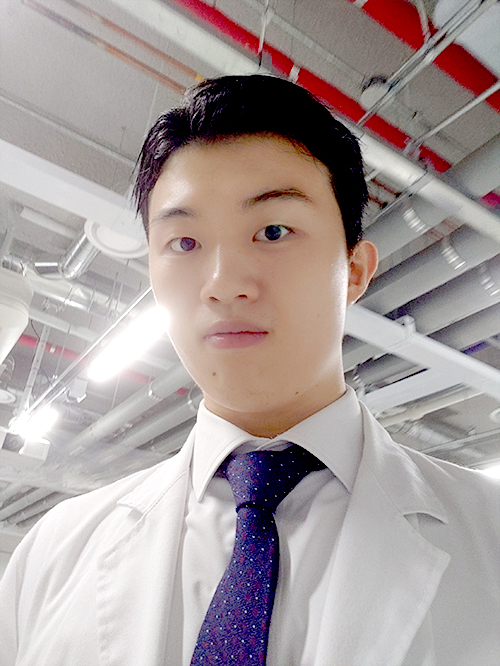
지난번에 제 휴대전화 용량이 가득 차 사진을 못 찍어드렸던 걸 기억하는지요?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기념으로 산 휴대전화를 졸업을 목전에 둔 여태까지 써 왔으니 말썽을 일으킬 때가 되기는 했건만, 왜 얄궂게도 딱 그때 용량이 가득 차버리는지!
두 번의 불상사는 막기 위해, 그날 방으로 돌아와 얼른 휴대전화 앨범에 필요 없는 옛 사진들부터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활로 불어난 살이 채 빠지지 않은 새내기 시절의 사진,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동아리 사람들과 의예과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좁디좁은 자취방에서 처음 요리를 한 뒤 뿌듯한 마음에 찍은 사진. 앨범을 하나하나 넘기며 정리하는 작업은 일종의 시간여행이기도 합니다. 지울 것은 지우고 남길 것은 남기며 앨범을 넘기다 보니 앨범 속 시간은 어느새 본과 1학년 여름방학, 당신과 함께 자전거 국토 종주길에 올랐던 그날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난했던 첫 학기를 끝낸 우리는 놀러 다니기도 바쁜 시간을 자전거로 국토를 종주하는 데 쓰기로 결심했었지요. 달리는 중간중간에 찍는 바람에 흔들린 사진들을 지우던 제 손은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수안보온천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 앞에서 유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몸과 자전거 하나만 믿고, 문경새재를 넘는다는 말의 무게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 한 치 앞을 모르는 웃음이 마치 골학 수업 직전에 찍은 셀카 속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탄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억하나요? 대학생인 우리도 오르막에서 낑낑거리며 고전하는데, 족히 일흔은 넘어 보이는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너무도 쉽게 우리를 앞질러 가는 게 어찌나 경악스러웠던지! 직전 사진에서 느껴지던 우리의 자신감이 박살난 순간이었지요. 그 할아버지를 따라잡아 보겠다고 무리해서 페달을 밟았지만, 다음 사진 속 우리가 길가에 퍼질러 앉아 물을 들이켜고 있는 걸 보면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나 봅니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시도였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탄 자전거는 전기자전거였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으며 룸메이트를 이겨 먹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 가랑이가 찢어져 1년만에 백기를 들었던 제 모습을 겹쳐 보았다면, 부디 잊어주길 바랍니다. 하필이면 그 룸메이트가 훗날 ‘과탑’이 될 인재일 줄, 저인들 알았겠습니까.
이어지는 몇 장은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부쩍 사진의 수가 늘어난 걸 보면, 사진을 찍는다는 핑계로 어지간히도 많이 자전거를 세웠나 봅니다. 정작 내리막길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릴 때는 속도를 내느라 주마간산으로 지나친 풍경이 가장 고생스러운 오르막길에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추억들도, 학사일정이 널널할 때보다는 오히려 시험을 앞두고 봉두난발을 한 채 함께 밤을 지새울 때 대부분 만들어졌군요. 얼마 공부하지도 않은 주제에 쉴 줄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커피를 한 잔씩 들고 화단 앞 벤치에 앉아, 한국 의료계의 폐단과 사회의 부조리를 성토하던 3학년 연말의 우리가 기억납니다.
소조령 꼭대기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 다음에는 망연자실한 당신의 표정을 담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겨우 고개를 넘었나 했더니 더 높은 이화령이 앞에 버티고 있었을 때 어찌나 낙담이 되던지요. 겨우 시험 하나를 마쳤더니 어느새 눈앞에 다가온 다음 시험을 보고 절망하는 경험은 학기 중이면 충분했을 텐데 말입니다.
적다 보니 우리의 오르막 여행 사진에 6년간의 의과대학 생활을 대응시키는 재미가 꽤 쏠쏠하군요. 아니, 생각해 보면 굳이 의과대학 생활에 국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시험이 끝난 뒤 의사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이름 석 자마저 잃고 ‘인턴쌤’으로 불리며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난리가 나는 세상에서 주 80시간을 일하며 4년을 살아가는 레지던트로서의 삶이지요. 그 뒤에도 펠로우 생활, 연구 실적 압박, 개원가에서의 경쟁... 오르막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오르막일 뿐입니다.
수많은 선후배와 동기들이 오르막을 꾸역꾸역 오릅니다. 누군가는 시작부터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다가 중간에 굴러떨어집니다. 누군가는 매 순간 고통을 견디는 표정으로 억지로 몸을 끌고 올라갑니다. 오르막 다음에 이어질 내리막을 기대하며 오르는 이도 있지만, 내리막의 짜릿함마저 오르막을 오르는 데 들인 공에 비해서는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끝없이 채찍질하거나 ‘여기만 지나면 편안한 내리막길일 거야’라는 희망만을 붙잡아서는 이 오르막을 절대 완주할 수 없음을, 당신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그때 깨달았던 오르막길의 지혜를 돌이켜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조급해하지 않고, 느린 속도를 오히려 경치를 감상할 기회로 삼으며, 내리막길을 앞두고도 다음에 이어질 오르막길을 예상하며 담담히 준비하는 것. 오르막길의 미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그 길은 아무리 길고 험난할지언정 ‘갈 만한 길’일 것입니다. 소조령보다 더욱 가파르고 힘든 이화령을 오르면서도 사진 속 우리의 표정은 오히려 점점 더 밝아졌던 것도, 그 이치를 깨우쳤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날의 마지막 사진에는 문경시청 앞에서 티 없이 맑게 웃는 우리 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문득 오르막길의 지혜가 하나 더 떠오르는군요. 바로 그날 문경새재를 오를 때도, 6년의 의대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도, 저는 항상 당신과 같은 벗을 곁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라건대, 나도 당신에게 그러한 벗이기를,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함께 이 길고 긴 오르막길을 지혜롭게 웃으며 오를 수 있기를.